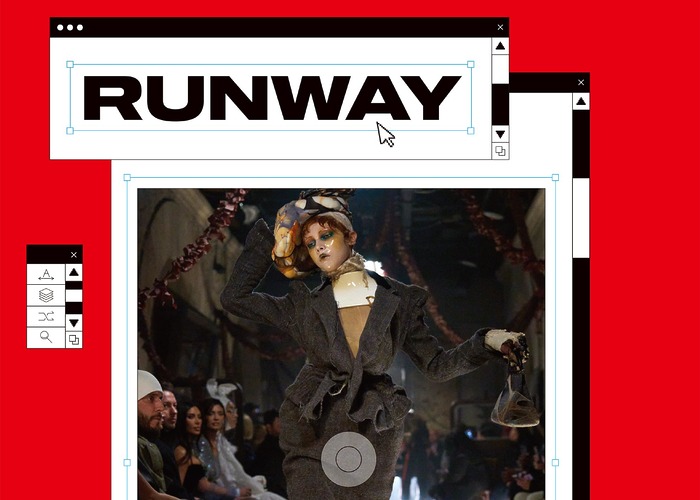여름으로 가는 문 2
천둥 번개가 온 도시를 뒤흔든 며칠 후, 거짓말처럼 파랗게 갠 하늘을 따라 남쪽으로 달렸다. 그곳에서 만난 풍경은 온통 초록이었고, 어김없이 꽃이 피었다. 청보리가 머리를 세우고 동백꽃이 툭툭 떨어지는 고창, 대나무 숲을 흔드는 담양과 배꽃이 들판 가득 피었던 나주, 그리고 작약의 흰 봉오리가 열린 강진. 그곳에서 여름의 문을 열었다.

담양 맛보기
대나무밭을 끼고 있는 ‘죽림원가든’의 대나무 숲속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듬성듬성 놓인 평상 역시 대나무로 만든 것이었는데, 높이 솟은 대나무 사이사이로 죽순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다. 이 죽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서, 하필 야외 냉장고 밑으로 자라는 바람에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난리였다. 이렇게 자라는 죽순을 바로 베어서 삶은 우렁이를 넣고 매콤하게 무쳐내면 죽순회다. 죽순은 4월부터 6월까지 가장 많이 나는데, 이 시기에만 생죽순회를 먹을 수 있다. 대통밥이나 대통에 쪄낸 백숙도 판다. ‘대나무촌닭’을 주문하면 제철 나물 반찬과 녹두를 넣어 끓인 닭죽이 함께 나온다. 전라남도의 다른 지역처럼 담양도 고유브랜드를 가진 ‘담양 대숲 맑은 한우’를 키운다. 담양의 한우거리에 많은 고깃집이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된다면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협식당’도 좋다. ‘육사시미’로 불리는 한우 생고기나 전라도식으로 매콤하게 무친 육회 한 접시가 1만5천원, 식당에서 최고로 비싸고 최고로 맛있는 한우 꽃살이 2인분에 4만원. 가격을 잘못 봤나 싶을 만큼 저렴한 가격인데, 지방이 고루 퍼진 고기를 살짝 구워 양파를 얹어 먹으면 온 입안이 뿌듯하다.
남도답게 김치며, 갓장아찌의 맛도 개운하고 선지해장국과 생고기비빔밥, 생간과 천엽 한 접시도 그냥 받기 황송하다. 관방제림 옆에는 담양 국수거리가 있다. 잔치국수 대신 ‘멸치국물국수’, 비빔국수 대신 ‘열무매운국수’를 파는데, 가격은 한 그릇에 3천원. 아무래도 담양천을 내려다보는 바깥 평상에서 개다리소반에 양반다리를 하고 먹는 맛인 것 같다. 담양에서만 파는 청량한 ‘댓잎주’나 부드러운 ‘댓잎탁주’ 한 병을 시켜놓고, 국수가 나올 때까지 ‘약계란’을 상 모서리에 팍팍 쳐서 까 먹는 맛도 있다. 약계란은 국수거리의 또 다른 명물로, 온갖 한약재와 함께 달걀을 삶은 것이다. 껍질을 까보면 겉이 장조림 달걀 색깔로 물들어 있는데, 은은한 향이 난다. 담양의 자랑인 떡갈비도 빼놓을 수 없지만, 담양 사람들은 돼지갈비구이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간밤 축제의 현장에서 돼지갈비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었나 보다.
담양에서 산책하기
담양 곳곳이 아름답다. 죽녹원 같은 큰 대나무 숲을 걸을 때면, 대나무가 얼마나 빛을 예쁘게 투과하는지 알게 된다. 대나무가 만들어내는 시원한 기운 때문에 한여름에도 바깥보다 온도가 7도나 낮다는 숲. 높이 뻗어나간 기둥에서 여리게 뻗어나간 나뭇잎들 사이로 햇볕이 들어온다. 바람에 따라 나뭇잎이 흔들리는 동안 햇볕과 그림자가 번갈아 자리를 바꾸고, 그게 너무 빨라서 반짝반짝거린다. 그 빛이 얼굴에 드리우면, 늘 보던 얼굴이 더 예뻐 보이곤 한다.
죽림원에서 다리를 건너면 관방제림이다. 담양천이 범람할까봐 제방을 높게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심어 가로수를 만들었다. 무려 400년 전에 만든 곳이다. 나무의 나이를 짐작해볼 만한데, 자세히 보면 다 보호수로 지정되어 작은 팻말을 하나씩 달고 있다. 돌을 놓아 만든 징검다리를 건너서 관방제림을 산책하길. 담양천과 가까운 아랫길도 있고, 높은 제방길은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시원하다. 중간중간 평상이 놓여 있어 쉬기 좋다. 이 평상에도 경로우대석이 있다.
낮의 축제는 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훨씬 조용하고 여유롭다. 하천에 대나무를 둘러 만든 가두리 양식장에 메기와 가물치, 잉어를 풀어놓고 아이들이 통발로 고기를 잡는 행사도 열리고 있었다. 노인 한 분이 한 마리당 1만원의 현상금까지 걸었는데도 도통 소득이 없었다. 아이들이 반바지를 입고 물속에서 첨벙거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건, 막 5월에 들어선 담양이 한여름처럼 따뜻하고 빛났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여름을 맞았는지도 모른다.
관방제림을 끝까지 걷다 보면 굴다리 하나를 두고 유명한 메타세콰이어 길과 연결된다. 메타세콰이어는 남쪽에서만 자라는 나무다. 그 크고 시원시원한 용모는 나무들 사이에서도 으뜸이다. 전국에서 가장 크고 잘생긴 메타세콰이어가 모여 있는 이 길은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두발자전거부터 2인용 자전거, 마차를 닮은 4인용 자전거까지 등장한 관광지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아침 일찍 찾아가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 길을 호젓하게 걸을 수 있다. 다행인 건, 담양 곳곳에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심어져 있다는 것이다. 꼭 이 메타세콰이어 길이 아니더라도 우연히 나만의 메타세콰이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돌아서 오는 길
시계의 시침이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다고 알려도 억울한 기분이 드는 건, 역시 집에서 너무 멀리 왔기 때문이다.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이었으면 싶고, 일주일을 머물러도 하루씩 더하고 싶은 욕심은 여행에서 늘 마주치는 감정이다. 서울에서 5시간이나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역시 아쉽기만 하다면 천천히 주변 지역을 돌아보면서 서울로 향하는 것도 좋겠다. 요즘 복원이 한창인 강진읍성에 갈 수도 있고, 차밭이 길게 이어진 보성이나 꼬막의 고장인 벌교를 가는 것도 담양에서는 정말 가까우니까 말이다.
강진읍성을 가려면 나주의 시골길을 지나가야만 했다. 작은 길 양옆은 온통 배밭이어서, 하얀 배꽃이 가득한 길을 구불구불 달리게 되었다. 산속 길에서는 다람쥐가 무단횡단을 했다. 한창 길 구경을 하다 보니 강진읍성이 나왔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든든한 방어벽이 되어준 강진성은 상당부분 허물어졌는데, 요즘 복원이 한창이다. 회색 돌성벽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전국에서 미식가를 불러들이는 유명한 밥집이 두 곳 있는데 바로 수미원과 설성식당이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 들어가 머쓱하게 앉아 있으면 상째 남도한정식을 들고 들어오는 곳이다. 설성식당은 병참리 마을 끝에 홀로 동떨어진 것처럼 밭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서 있다. 그러니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길 쪽으로 참숯화로를 내서 돼지주물럭을 바싹 굽는다. 제철 재료로 차린 반찬은 화려한 것은 없지만 다 입에 잘 맞는다.
이곳의 매력은 맛이 전부가 아니었다. 식당 뒤쪽 과수원에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궁금해서 -감나무로 밝혀졌다 – 밭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향기로운 냄새가 범상치 않았다. 자세히 보니 조금씩 봉오리를 피우기 시작하는, 작약꽃이었다. 설성식당은 거대한 작약꽃밭 가운데에 있었다. 허름한 식당이 낭만적 식당으로 바뀌어버렸다. 6월이 되면, 이 꽃밭에 흰 것 붉은 것 가리지 않고 탐스러운 작약이 가득 핀다고 한다.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떠난 여름 마중. 여행 길에서 여름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최신기사
- 에디터
- 피처 에디터 / 허윤선
- 포토그래퍼
- 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