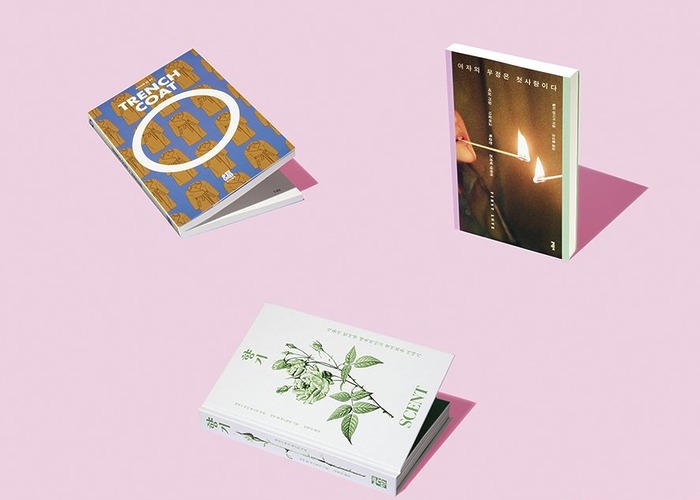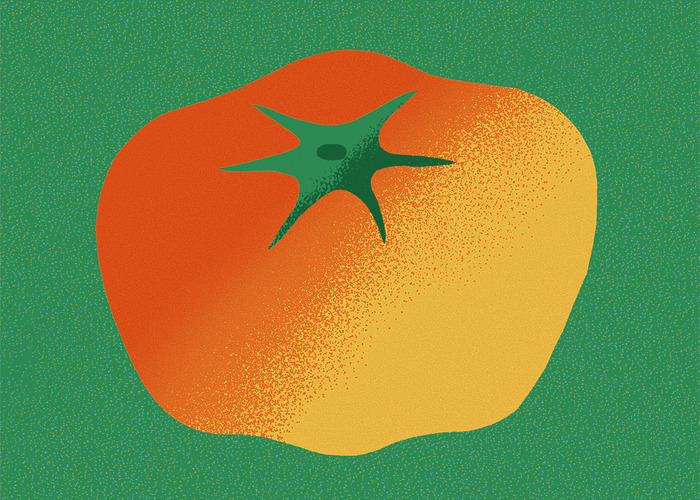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2025ver. 가족의 정의에 대해
당신에게 ‘가족’의 의미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 지난 4월 2일 2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독일의 과학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가 올린 영상의 제목이다. 이 영상은 공개 10일 만에 조회수가 1000만에 이른다. 유례없는 인구 붕괴로 향하는 한국의 저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의 심각성을 따끔하게 꼬집은 영상은 ‘정상성’을 향한 우리의 집념을 반성하게 했다. 치열한 경쟁과 보수적·문화적 관습은 다양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가족 복지 범위를 열악하게 만들었다. 2020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비혼 출산율은 약 42%인 데 비해 2023년 기준 한국은 신생아의 4.7%만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났다. 비혼 출산은 여전히 문제시된다. 30대 중반임에도 기혼보다 미혼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주변 지인조차 꿈꾸는 가족의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동성 연인과의 양육, 반려견과의 동거, 비혼 양육, 뜻이 통하는 친구와의 동거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가족을 꾸리고 싶다는 욕구는 똑같다. ‘가족 만들기’라는 우리의 창창한 꿈은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
비극적이게도 현재 한국 현행법상 비친족 가구는 대부분의 정책에서 소외된다. 각종 지원 정책이 법적 가족이나 1인 가구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법적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와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는 54만5000가구에 달한다. 10년 전 수치보다 2.5배 증가했다. 2014년 진선미 의원을 시작으로 생활동반자법이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삶의 방식과 생애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들은 매년 증가하는 셈이다. 해외에서는 일찍이 혼인에 준하는 결합과 파트너십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동반자의 관계를 혼인 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 40개국에 달한다. 생활 동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 역시 다양하다.
1999년 시작된 프랑스의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시민연대계약)는 비혼인 동거 커플, 편부모 가정을 비롯해 생활 동반자의 권리를 보장한 법적 제도로 평가받는다. 가족이 아닌 두 성인이 함께 삶을 꾸려가는 것을 보장하고 법적 권리를 제공해 함께 거주할 의무를 지니며, 물질적 지원과 상호 부조의 의무를 갖는다. 건강보험, 실업수당, 사망보험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휴가, 시민권, 상속권, 거주권, 공동양육권 등을 보장한다. 2022년 기준 프랑스 신생아의 약 63.9%는 비혼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PACS는 ‘동거는 두 사람, 즉 서로 다른 성별 또는 같은 성별의 두 사람이 커플로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춘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결합이다’라고 명명한다. 이 관계는 대부분 연인 간 합의를 뜻하지만 꼭 로맨틱할 필요는 없다. 네덜란드의 경우 등록 파트너십(Registered Partnerships) 제도를 통해 결혼하지 않더라도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제공한다. 영국 역시 2005년부터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을 시행해 상속권과 주거권, 수술 동의서, 연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 역시 성관계를 의무로 하지 않기에 파트너의 선정은 꼭 연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미국, 스웨덴, 캐나다 역시 선택 가족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미국 가족 의료 휴가법에 따르면, 혈연이나 법률혼 외에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밀한 자를 대상으로 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 돌봄 휴가 대상에도 적용된다. 양육 형태도 다양하며, 체외수정을 통해 아이를 갖는 것도 합법이다.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에서는 미혼 출산에 국가 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유럽에서는 양육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이상적 가족을 찾는 커뮤니티(familyship.org)도 등장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정자 기증자부터 부모, 이모, 삼촌 등 다양한 역할을 원하는 이들이 모여 아동 중심의 이상적 가족 꾸리기를 돕는다. 현재 이 사이트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거주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무려 1만2000여 명이 이용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은 시점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동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애완동물’보다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는 의미의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해졌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아직 요원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98조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인간이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다”에 근거해 동물의 지위는 여전히 ‘물건’에 준한다. 동물의 법적 지위가 인간에게 귀속되기에 학대와 유기 속에서 이들을 위한 보호 제도 역시 절실한 상황이다. 제21대 국회에서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동물이 물건의 지위에서 해방된 국가에서는 반려동물 책임보험부터 유산을 물려주는 신탁법을 비롯해 다양한 복지가 선행된다. 1890년 세계 최초의 동물 보험 정책이 마련된 스웨덴은 2021년 기준 반려견 90%, 반려묘 50%가 펫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일본 역시 2013년 반려동물에 대한 평생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동물 애호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험 시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1992년 헌법 개정과 동시에 동물을 생명으로 인정한 스위스에서는, 토끼와 기니피그 같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은 1쌍을 함께 길러야 하는 가이드가 존재한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서 ‘가족’이 자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변화는 선택지를 보다 풍요롭게 넓히는 일이 아닐까.
- 포토그래퍼
- 정원영
- 제품 협찬
- LEGO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