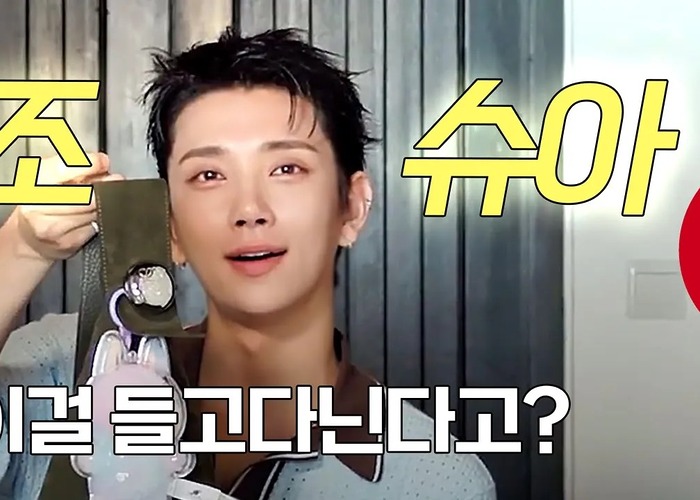쇼핑도 힐링이 될 수 있나요
쇼핑은 지친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의 요령이 된다. 지금은 맞고 내일은 틀리더라도 말이다.
어느 날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넷플릭스 쇼 〈곤도 마리에: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를 보았다. 주변에서 다큐를 보고 집을 청소했다는 둥 물건을 왕창 버렸다는 둥 진한 후기들이 자자했던 TV쇼다. 다큐에서 힌트를 얻어 연예인의 집을 정리해주는 예능 프로그램까지 등장했고 저 멀리 미국에서는 그녀 덕분에 정리 붐까지 일었다고 하지만 맥시멀리스트인 내게는 썩 와 닿지 않았던 제목이다. 고단한 날에는 뭐 하나라도 사고 싶어 집 앞 편의점이라도 기웃거리는 나니까. 집에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하나씩 짚어가며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를 외치는 곤도 마리에의 명령은 물건과 나 사이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이 가방은 누구랑 샀지? 반짝이는 이 목걸이는 언제 샀더라? 이 옷은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었네? 으쓱한 마음으로 쇼핑백을 어깨에 메고 매장 문을 나섰을 나는, 언제 왜 쇼핑을 했을까?
필자는 큰 사건을 마주하거나 고된 일을 마쳤을 때면 해외 온라인 편집숍을 뒤적이거나 매장을 구경하는 게 일이었다. 이렇다 할 목적이 없는 쇼핑은 대부분 그저 마음에 들어 산 물건들. 집에는 크고 작은 새 물건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홧김에 혹은 기분이 내켜서 등 이유는 많았다. 명품을 턱턱 살 만한 재력은 없지만 내 기분을 풀어주는 방식에 통이 커진 건 사실이다. 딱히 쓸모는 없지만 포만감을 안겨주니까. 값비싼 명품이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무언가를 손에 쥐었을 때 회복되는 기묘한 몸과 마음은 소비=행복 수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자본주의 사회 속 학습된 현대인의 허기를 달랜다. 부작용이 있다면 갈증이 날 때 물 대신 콜라를 찾는 욕구처럼 익숙한 자극이 된다는 것. 그렇다면 쇼핑은 정말 힐링이 될까? 답은 Yes일 수도, No일 수도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되어 있던 소비심리가 폭등했고 2021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 중 백화점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다는 데이터는 쇼핑이 사람들에게 힐링, 즉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방증한다. 애석하게도 팬데믹 시대의 해우소가 쇼핑이 된 것이다. 힐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외여행을 대신해, 공항이 아닌 백화점이나 편집숍으로, 이국적인 풍경 대신 신상품을 마주하는 현실이 가혹하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덜 슬프기 위해 지금보다 더 기쁘기 위해 나 자신을 달래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 비록 힐링이 유지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지라도.
과도한 쇼핑은 때로는 누군가의 미움을 사기도 하는데, 미니멀 라이프를 추종하는 세력은 환경을 위해 최대한 적게 소비하자고 일침을 가한다. 다시금 곤도 마리에의 질문이 떠오른다. 쇼핑의 순간이 비록 매력적일지라도 그 힐링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면 우리는 굳이 힐링에 돈을 지불할 이유가 있을까? 어쩌면 찰나의 시간이 될지 모를 소비의 굴레에서 조금은 벗어나도 좋지 않을까? 비록 맥시멀리스트에겐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올여름 지독하기까지 한 폭염이 이어졌고 유럽에는 난데없는 폭우가 내렸다. 우리가 지구를 막 대해 받은 업보다. 산업화 이후 소비는 풍요의 척도가 됐고,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팬데믹 시대에도 잡동사니 물건을 사 모으는 ‘클러터코어’라는 신종 맥시멀리스트가 트렌드로 꼽힌다. 물욕은 인간의 의식주를 넘어서는 기본 욕구가 되어 반짝이는 쇼윈도에 진열된 상품에 쉽게 현혹되게 만들고 우리를 물질 과잉 상태로 이끈다. 기분 좋게 쇼핑을 해도 마음 한켠이 불편한 이유다.
그렇게 치면 사실 힐링을 위한 방법이 꼭 쇼핑일 필요도 없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를 위해 돈을 쓰는 일은 그게 명품을 사는 일이 됐든 필라테스를 등록하는 일이 됐든 내일도 고단한 환경에 놓일 나에게 살아갈 힘을 더해주는 요령이지 않을까? 지친 나에게 살아갈 힘을 더해주는 의식 같은 것. 비록 내일 교환이나 환불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쇼핑할 때 즐겁다는 거다.
- 프리랜스 에디터
- 김보라
- 포토그래퍼
- HYUN KYUNG 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