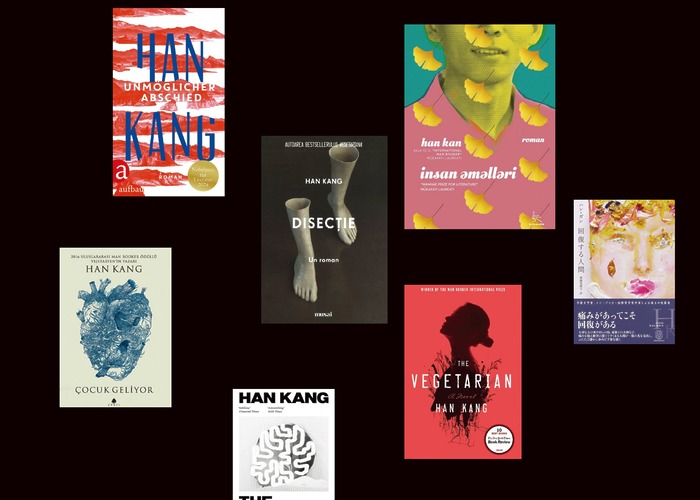술과 음악
어느 술집에서는 술맛보다 음악의 맛이 더 감긴다. 술집의 음악은 왜 중요한가? 음악을 틀고 싶어 레코드 바를 차린, 음악 칼럼니스트의 단상.
같은 자메이카라도 백인들이 이용하는 고급 리조트의 배경음악은 비치 보이스의 ‘Kokomo’고, 킹스턴 빈민가에서는 메이톤즈의 ‘Money Worries’다.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지만 사람은 시계를 찰 곳과 차지 않을 곳을 구분한다. 어디에서 들어도 적합한 음악은 사실 없다.
‘멜로디 바’라는 부제를 걸고 소위 ‘레코드 바’ 영업을 시작한 지 4개월째, 뿐만 아니라 혼자 듣는 음악과 함께 듣는 음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정식의 ‘추억 속의 그대’에 대한 손님들의 열렬한 반응이 처음이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가장 많이 올랐고, 가장 많은 피드백을 받았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Good Bye’에서 색소폰을 연주했던, 1990년대 웬만한 가요 앨범의 색소폰을 도맡은 그 이정식이 맞다. 1990년대 초반 여러 가요 곡을 색소폰으로 연주한 2집 앨범 <Love II> 수록곡이다.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보다 BPM은 낮췄지만 키는 더 높이고 리듬은 더 ‘다이내믹’하게 편곡했다. 그렇게 침울한 정서가 싹 사라지자 ‘칠(Chill)’해졌다. 수년째 사람들이 아끼는 ‘시티팝’처럼 감상적이면서도 늘어지지 않는 음악이 됐다. 그만하면 원곡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를 한번 틀어볼 법도 한데, 이정식의 ‘추억 속의 그대’만 계속 튼다.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가 혼자 듣는 음악이라면, 이정식의 ‘추억 속의 그대’는 함께 듣는 음악이다. 하지만 혼자 듣는 음악과 함께 듣는 음악이라는 정의에는 수많은 부작용이 따른다. 마이너 코드를 사용한 애상적인 음악이 혼자 듣는 음악일까? 두 곡 모두 메이저 코드다. 댄스 플로어에서 꺼리는 느린 박자를 가졌으면 혼자 듣는 음악일까?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가 더 빠른 곡이다. 음악학적 편견은 이 분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가 대중적으로 더 성공한 곡이다. 많은 사람이 공감했던 음악에 덧붙이는 혼자 듣는 음악이라는 분류는 궁색하다. 클럽이 아니라 카페에서 함께 듣는 음악일 수는 있을 테니까.
대중음악은 사람들의 관심과 음악에 담긴 욕망 사이의 줄다리기다. 애초에 소수의 사람이 듣기를 바라는 음악에 부여된 명칭이 아니다. 대중음악을 정의하는 확실한 특징 중 하나로 4분 이내의 악곡을 들 수 있다. 싱거운 사실 같지만 4분에 담긴 역사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현재의 측면 기록형 디스크의 원형인 베를리너의 10인치 디스크는 한 면에 3분가량 녹음이 가능했고, 한 면에 25분가량 녹음이 가능한 12인치 LP 시대에도 3~4분 길이의 노래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초깃값이었다. 라디오 역시 청취자들에게 비교적 많은 음악을 들려주면서 광고도 송출할 수 있는 적정 시간을 4분 이내로 설정해 그 역사를 이어갔다. 대중음악의 형식적 한계는 필연적이었다.“ 전주와 후주를 제외하고 32마디를 작곡했을 경우, 8bit 기준 BPM 120일 경우 재생시간이 약 2분 8초가 된다. 따라서 전주, 후주 혹은 코다 4~8마디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대략 32마디 내외에서 곡이 끝나야 했다. 그 안에 반복을 통해 통일감을 주면서도 변화를 통해 다채로움을 주어야 하니 두 도막 이상을 작곡할 수가 없었다.”(더 궁금하다면 베 토디의 <대중음악은 왜 4분이 되었는가>를 참고하시라.)
4분 이내의 악곡이 대중음악의 이론적 정의라면 실천적 정의는 ‘유행’이다. 당대의 사람들이 향유하지 않는 과거의 음악, 이제 매우 니치(Niche)한 시장이 된 음악을 대중음악이라 부르기는 뭣하다. 메탈리카의 ‘Enter Sandman’은 1991년 당시 빌보드 싱글차트 16위의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던 곡이지만, 헤비메탈, 슬래시 메탈이라면 몰라도 지금의 대중음악이라고 하기는 마땅치 않다. 이정식의 ‘추억 속의 그대’는 절찬리의 시티팝 감수성에 한 발 걸쳐 있다는 점에서 요즘 음악이다. 공히 대중음악은 친근해야 한다고, 이 사실들은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면, 대중음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미국 음악을 들 수 있다. 10인치 디스크도, 라디오 방송국도, AAA, AABA, AB, ABC 같은 대중음악 형식도 다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반세기가 넘도록 전 세계에 전파된 빌보드 차트의 위상도 무시할 수 없다. 시티팝은 미국의 재즈, 소울, 훵크의 퓨전이며,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를 막론하고 바이닐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점유하는 음악은 단지 전통 음악이 아닌 미국 음악 취향이 강력하게 반영된 전통 음악이다. ‘문화 제국주의’ 같은 말은 음악이 외식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고, 미국이 20세기에 만든 숱한 대중음악은 고전음악과 구별되는 쉽고도 직접적인 음악적 쾌락의 발명이었다. 이제 함께 듣는 음악을 정의할 차례다. 이정식의 ‘추억 속의 그대’가 함께 듣는 음악인 것은 이 곡이 미국음악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미학 분야의 가장 유명한 명제 ‘아는 만큼 보인다’가 여기에서 나온다. 어떤 예술 장르든 수용자가 가진 정보의 양과 질이 해당 작품의 이해와 감동의 크기를 결정한다. 미국음악은 음악 공부는 만무하고 음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거 디스코네” 수준의 정보로 동기화돼 있다. 블루스, 포크 결합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1990년대 한국식 발라드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보다는 이정식의 ‘추억 속의 그대’의 음악적 정보가 지금 세대에게 더 많이 입력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무용 악보처럼 함께 듣는 음악에 얽힌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여튼 공유 가능하도록 기록해보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음악 취향이더라도 수어사이덜 텐던시스(Suicidal Tendencies) 같은 극단적인 하드코어가 함께 듣는 음악으로 적당할 리 없으며, 컨트리처럼 미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담긴 음악도 마찬가지다. 미국음악은 대중음악을 모조리 풀이해낼 수 있는 만능의 공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제약으로서 가치 있다. ‘대중음악이 곧 미국음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을 가늠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좋은 술집 음악에는 기본적으로 익숙한 측면이 있고,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미국음악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지만 지금의 ‘레코드 바 붐’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
레코드 바를 운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젊은 세대가 미국음악 이외의 새롭고 낯선 음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과정이기도 했다. 페페 자파타의 차차차 곡을 틀었을 때 두 손 번쩍 들고 춤추는 손님을 마주할 거라는 것도, 민요와 레게를 결합한 민요 크루세이더스의 ‘Otemoyan’을 틀자 손님들이 차례로 재킷을 받아 들어 앞뒤로 훑어보는 풍경을 만날 거라고도 예상치 못했다. 차트에서 만나는 음악 이외의 음악에 대한 호기심, 곧 열린 태도가 있었다. 사운드클라우드의 대두, 클럽 문화의 부흥, 바이닐 레코드의 귀환, 유튜브의 광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불러온 것은 차라리 정보가 아닌 태도인 듯했다. ‘레코드 바 붐’은 대중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이전과 사뭇 달라진 요구가 터져나온 결과 같았다. 미국음악 너머의 음악, 나만의 음악을 찾길 바라고 또 그것이 가능한 세대가 도래해 있었다. 이제 혼자 듣는 음악이라는 수식은 그 말이 소극적이고 내밀한 음악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점에서 좀 부정확해 보인다. 혼자 듣는 음악이 아닌 함께 듣는 음악이 되기를 기다리는 음악이 미국음악의 반대편에 있을 것이다. 술집은 미국음악 너머를 실현하는 격식 없고 일상적인 장소일 수 있을까, 일본의 재즈 키사 같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최신기사
- 에디터
- 허윤선
- 포토그래퍼
- OH EUN BIN
- 글
- 정우영(멜로디바 ‘에코’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