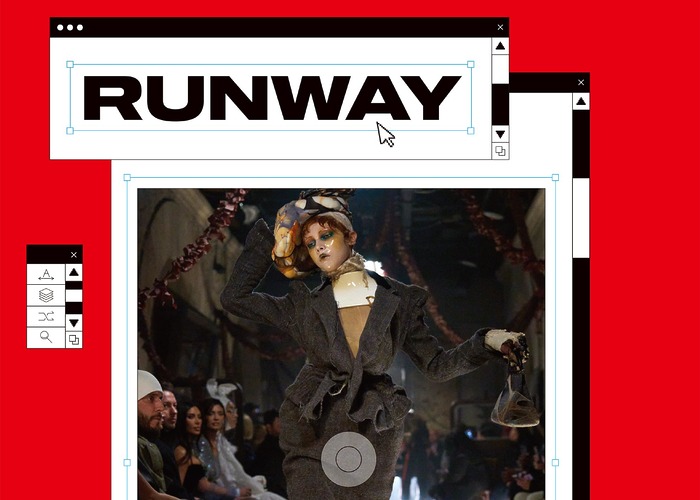남자의 미래는 치마다
남자도 치마를 입는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건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다.
여자 옷 입는 남자
“남자는 남자다워야 남자”라는 실체 없는 남성성을 강조한 아버지 교육의 반작용이 아닐는지 혼자 의심하는데, 온라인 쇼핑을 하든 백화점을 가든 친절하게 나누어진 여성복과 남성복 섹션을 마주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 되고 만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내동댕이쳐질 것 같은 불안과 위압감을 느낀다. 결국은 짜증 가득한 얼굴로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남자 여자 따지고 나누는지, 촌스럽다 촌스러워!”를 입에 달고 내빼기 일쑤. 나는 남자라서 남자옷도 입고 여자옷도 입는다. 내 패션 세계에 남은 편견과 한계는 사이즈와 가격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슨 프릴 장식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블라우스나 온 동네 아스팔트를 휘젓고 다니는 롱 새틴 드레스를 찾아 입는 크로스 드레서는 아니다. 골반과 엉덩이를 지그시 조이듯 딱 맞는 바지나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줄 알았더니 어디 한 군데 은밀하게 끼를 부린 코트에는 둔탁한 남성복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민함이 있다. 그래서 로에베의 여성 코트를 사서 잘 입었다. 돌아온 발렌시아가의 쿠튀르 드레스가 간직한 드라마는 어찌나 황홀하던지. 그걸 쫙 빼입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남자다운 치마
2021년 남성 패션의 중심에 젠더리스가 있다. 패션이 젠더리스를 주장하고 소비한 건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오늘의 상황은 터지기 직전의 화산처럼 절정에 달한 듯 보인다. 올봄 뮤지션이자 배우인 키드 커디가 코트 코베인을 연상시키는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입고 <SNL> 무대에 선 일이 화제였다. 그가 입은 꽃무늬 원피스를 만든 건 오프화이트의 수장 버질 아블로. 그의 치마 사랑은 더 나아가 자신의 여섯 번째 루이비통 컬렉션에서 아프리카 가나의 전통 의상에서 영향받은 랩스커트와 스코틀랜드의 타탄체크 킬트 스커트까지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비롯한 남자 치마를 선보이기에 이른다. 첫 번째 남성복 컬렉션을 선보인 리카르도 티시의 버버리는 지루한 트렌치코트에 플리츠 스커트와 드레스를 절묘하게 레이어드했고, 디자이너 스테판 쿡은 허벅지가 훤히 드러나는 짤막한 스케이트 스커트를 아가일 니트와 매치했다. 자신의 정체성과 욕망을 컬렉션에 고스란히 담아낼 줄 아는 루도빅 드 생 세르넹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스커트는 굳이 묘사하자면 아주 시적인 동시에 더없이 선정적이었다. 아방가르드의 성전 알렉산더 맥퀸과 꼼데가르송은 패션이 예술이라는 달콤한 사기를 무조건 믿고 싶게 만들었으며 톰 브라운의 젠틀한 치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옷처럼 보일 지경이다. 2022년의 치마도 이미 정해졌다. 프라다의 2022 봄/여름 남성복 컬렉션에선 미니스커트를 입은 남자들이 분주히 해변을 걸었다. 아주 짧은 바지 위에 같은 컬러의 천을 덧댄 형태를 두고 쇼츠와 스커트를 합친 옷이라는 의미로 스코트라는 단어까지 새로 만들어진 상황. 우리에게는 치마바지라는 예쁜 말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치마를 입고
내게도 근사한 치마 딱 한 벌이 있다. 남자의 옷에 로맨스와 집착, 중독을 새겨 넣은 디자이너 스테파노 필라티가 각종 럭셔리 하우스를 두루 섭렵한 뒤 방황하듯 베를린으로 떠나 내놓은 브랜드 랜덤 아이덴티티가 그 주인공이다. 사회적 성 체제에 순응하는 옷 입기에 저항한다는 브랜드 이름의 의미처럼 스테파노 필라티는 남성복도 여성복도 아닌 중간적인 옷을 추구한다. 그는 중간적인 것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도전적인 미지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나의 첫 랜덤 아이덴티티 치마는 무릎까지 떨어지는 트윌 스커트 스타일의 검정 치마다. 3년 전 베를린 여행에서 구입한 뒤 베를린과 도쿄의 긴자, 방콕의 실롬 거리를 쏘다녔다. 환경과 분위기가 사람을 잠식하는 건지 아니면 그간 치마 스타일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 건지 서울에서는 치마를 입고 나선 일이 없다.
옷 입기에 있어서만큼은 타인의 시선과 판단이 궁금하지도, 담아 듣거나 반영할 마음도 없지만 어디 한번 그 시선을 관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화창한 토요일 오후 신사역 스타벅스에서 차가운 커피를 산 다음 횡단 보도의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평소와 다른 시선을 느끼진 못함. 가로수길을 걸으면서, 날이 꽤 더웠지만 온몸에 바람이 통하는 듯 가볍고 상쾌한 기분이 들어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림. 힐끔대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불쾌함을 느낄 정도는 아님.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식품관 입장, 엄마에게 건넬 과일바구니를 보는데 건너편에서 복숭아를 고르는 세 명의 중년 여성의 시선과 속삭임을 목격. 와인 코너에서 일하는 직원이 몇 차례 확인 끝에 말을 걸었다. “어머, 이게 치마인가 보네요. 난 또 통 넓은 바지인 줄 알고. 호호호.” 그냥 함께 웃고 말았다. 치마를 입고 과일바구니와 샴페인 한 병을 든 채 엄마를 만남. “역시 센스가 넘치십니다. 예쁘게도 입었네. 엄마도 한번 입어보자”라는 시시한 반응뿐. 용산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비웃듯 히죽거리는 시선을 느꼈고 피하거나 굴복할 이유가 없으므로 눈을 흘기며 빤히 쳐다봄. 아이파크몰에 머무는 동안 다양한 연령의 인파와 마주쳤지만 대부분 스치듯 쳐다보고 지나칠 뿐 사람들은 타인이 뭘 입고 다니든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니 입고 싶은 옷을 입으면 된다.
치맛바람
해리 스타일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젠더리스 트렌드의 선두 주자다. 그가 2020년 12월 <보그> 미국판의 표지 모델로 등장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창간 128년 역사상 <보그> 미국판 커버를 단독으로 장식한 최초의 남자라는 사실과 디자이너 해리스 리드의 하늘색 레이스 시폰 드레스를 입고 커버 촬영에 나선 점은 젠더리스 패션이 잠깐의 유행이 아닌 문화, 정치, 사회를 향한 도전의 메시지이자 새로운 세대의 언어 수단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해리 스타일스는 “남자옷, 여자옷이라는 편견 가득한 장벽을 벗어나면 우리 모두의 삶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960년대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으로 여성이 남성복을 입는 것에 대한 불편한 인식이 사라진 것처럼 더 많은 남자가 치맛바람을 일으킨다면 또 하나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다. 할리우드 스타를 비롯해 아드레날린 가득한 NBA 스타들이 치맛바람의 중심에 있다는 건 흥미로운 지점이다. 유타 재즈의 포인트 가드 조던 클락슨이 선두에 섰다. 타탄체크 스커트에 나이키 덩크 슈즈를 매치하면서 파파라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는, 톰 브라운의 스커트 등 다양한 치마 스타일링을 섭렵하는 중이다. 워싱턴 위저즈의 가드 러셀 웨스트브룩 역시 경기 후 퇴근길에 타탄 스커트를 입은 모습이 공개됐다. 배우 봉태규와 고경표, 방탄소년단의 지민도 치마 사진을 공개했으니 이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치마 입은 남자와 마주치더라도 촌스럽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 것. 옷은 사물이지만, 옷을 만드는 것도 입는 것도 결국 다 같은 마음이니까.
최신기사
- 에디터
- 최지웅
- 포토그래퍼
- GORUINWAY, COUTESY OF STEFAN COOKE, BURBE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