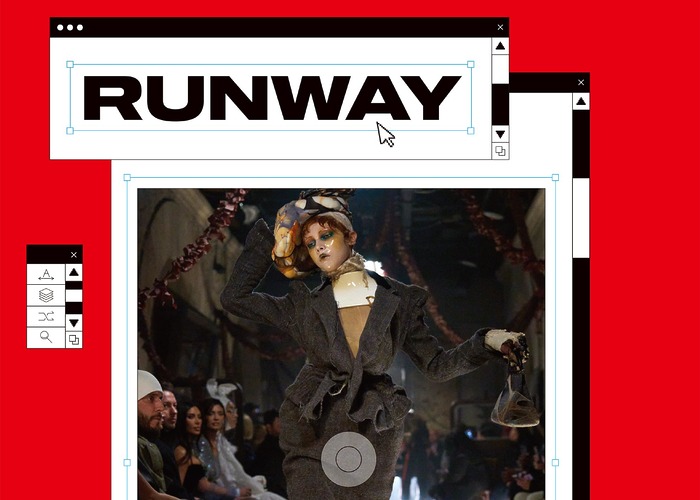에디터의 리트리트 #4 조소과의 힐링
손을 쓰는 순간 평온하게 비워진 머릿속에는 그 시절 추억만이 가득 찬다. 그저 꼼지락거리면 행복한 내가 쉬는 법.
미대 조소과를 졸업했다. 고요하게 그리는 그림보단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조형물이 좋았고, 스케치 속에 평면적으로 존재하던 작품을 입체적으로 끌어내는 게 신기했다. 흙을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철조, 목조, 석조 등을 배우면서 철재를 용접하고 나무를 조각하고 돌을 깎았다. 용접모를 쓰고 두 눈이 시릴 만큼 철조를 하고 나면 인중이 새까매지는 건 다반사. 전기 톱으로 나무를 조각한 날에는 얼굴에 박힌 자잘한 나무 가루들로 고생하기도 했고, 정육점에서나 볼 법한 절단기로 돌을 깎으면 작업복으로 무장하고도 머리에 새하얀 눈이 내렸다. 야작 후엔 동기들과 다 같이 먹는 기름진 삼겹살로 목구멍에 쌓인(?) 돌 가루, 나무 가루를 흘려보내는 게 낙이었던 때. 과제전 전날 목조 작품이 물을 먹어 발을 동동 구르고 철조 작품의 용접이 떨어지면서 밤새 응급처치를 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기억은 추억의 힘을 빌려 왜곡된다. 지금 내가 느끼는 건 그저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작업했던 모든 순간이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는 거다. 야작에 치여 살던 과실과 철조실, 석조 작업장, 온갖 석고와 폴리가 묻어 딱딱하게 굳은 작업복까지 눈에 선하다.
그렇게 대학을 마치고 뷰티 에디터라는 직업을 갖게 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가끔씩 전공에 기대 촬영용 소품을 직접 제작할 때도 있지만,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걸 꼼지락대며 완성해내는 것에 대한 갈증은 내내 있어왔다. 재미있는 건 대학 동기들 대부분이 나와 같다는 거다. 물론 전업 작가가 된 친구는 질색을 하지만 치위생사인 친구는 작업실을 만들 테니 용접할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부추기곤 한다. 회사원이 된 친구의 자취방에 놀러 갔더니 한켠에 조형용 스컬피와 스테인리스 헤라가 놓여 있는 걸 발견하고 다 같이 웃은 적도 있다. 딸아이의 엄마가 된 친구는 육아에 지칠 때면 집 근처 조소학원을 찾는단다. 이것이 조소과의 힐링이라나? 나 역시 예전에는 주말에 혼자 학교 과실에 찾아가볼까 생각도 했다. 아무도 모르게 작업만 하다가 올까? 누가 들어오면 그냥 졸업생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하고 고민도 많던 차에 그냥 뭐든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선 절대 불가능했던 거다. 지금 떠올리면 그만큼 간절했나 싶다. 결국 소심한 성격 탓에 고민만 하다 말았지만 이후 ‘원데이 클래스’라는 이름의 공방 체험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게 너무나 반가웠다.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가 등장하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되짚어봤다. 전공 수업 중 철조를 가장 좋아했고 평소에도 실버 주얼리를 애정했기에 짧은 고민 후에 주얼리 공방을 찾기로 했다. 제일 눈에 띈 건 을지로에 위치한 ‘에피스 주얼리(@aepice_official)’. 김지애 작가가 만든 주얼리 브랜드이자 간간이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는 이곳의 SNS를 둘러보는데 반지부터 목걸이, 이어링까지 전부 내 취향을 저격했다. 흔히 볼 수 없는 거친 마무리감과 패턴처럼 각인된 지문, 자유로운 디테일, 완성품이 아닌 듯 투박한 주얼리는 매끈하게 가공된 기성품보다 몇 배는 더 멋스러웠다. 내가 직접 반지를 만든다면 이런 형태일 거라 상상해왔던 그대로 말이다. 바로 예약을 하고 에피스 주얼리 공방에 발을 들였다.
몇 년 전에도 금속 공예가 궁금해서 같은 과 친구의 힘을 빌려 왁스 카빙까지는 해본 적이 있으나 전문적인 도구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흐지부지 끝나버렸었다. 아쉬움이 남던 중 제대로 된 금속 공예를 할 생각에 하루 종일 설렜다. 먼저 여러 가지 샘플을 참고하면서 만들고 싶은 반지를 스케치했다. 실톱으로 초록색 왁스를 원하는 두께만큼 자르고 리마를 이용해 내경을 넓히면서 손가락 둘레에 맞게 조절했다. 디자인을 구현할 땐 줄로 갈아내고 세심한 조각이 필요한 부분은 핸드피스 기기를 사용하는데, 내가 가장 좋아했던 작업이다. 전공 수업 때 다뤘던 기기와 비슷해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가득 찬 순간 온전히 그 작업에 집중하게 된다. 핸드피스의 바를 교체해가면서 계속해서 왁스를 갈아내고 얼추 원하는 모양이 나오면 디테일을 더할 차례. 왁스 표면에 인두기를 갖다 대면서 부분적으로 녹이면 된다.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자취를 남기듯 유연한 텍스처가 만들어지는 걸 보자 묘한 희열이 느껴졌다. 철조 시간에 했던 용접이 떠오르기도 했다. 왁스가 녹고 다시 굳기 직전, 너무 뜨겁지 않을 때 손가락으로 형태를 잡으면 지문이 찍히면서 한층 러프한 느낌을 낼 수 있다. 반지 내부에 손 글씨로 이니셜을 새겨넣는 것도 잊지 않았다. 디자인을 마무리한 뒤에는 왁스를 은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2주간 주물을 뜨는 과정이 필요했다. 주물 후 처음 마주한 반지는 은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뿌옇고 표면도 거친 상태. 사포로 갈고 다시 한번 핸드피스의 연마 바를 이용해 다듬는 연마 작업에 들어갔다. 반짝이는 광을 내고 싶다면 광택제를 바르기도 하는데, 적당히 매트한 표면이 마음에 들어 건너뛰었다. 드디어 내 손으로 빚은 반지가 완성됐다. 지금도 오른손에 분신처럼 착용하고 있는 이 반지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목걸이를 만들기도 했는데 링이라는 틀이 있는 반지보다 훨씬 다채로운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어서 매력적이다. 한동안 마감이 끝나면 주얼리 공방에 가는 일이 잦아질 듯하다. 아직 만들고 싶은 주얼리가 많아서 내친김에 친구들과 작업실을 만들어볼까 하는 터무니없는 기대도 해본다. 며칠 전부터는 틈날 때마다 금속공예용 핸드피스 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두기는 얼마인지, 개인 작품의 주물을 떠주는 곳은 어디인지 찾아보고 있다. ‘장비발’을 세우고 싶다는 게, 장비만 봐도 설렌다는 게 이런 건가 싶다. 진심으로 즐기는 게 있다는 건 놀랍고 행복한 일임이 분명하다. 급속 충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랄까. 내 컨디션의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온전한 휴식으로 채울 수 있는 일반적인 충전 방식이 있다면 공예는 그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나를 충전시키는 급속 충전 모드와 같다. 꼼지락대며 만들어내는 동안은 아무런 생각도 필요 없다. 쓸데없는 고민을 내려놓게 되고, 내일 해야 할 일, 이달에 써야 할 원고도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상상하는 그 시간이 평온할 뿐이다. 어쩌면 대학시절의 추억을 소환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그 방식은 주얼리가 아니라 뭐든 상관없기에. 내년에도 이 리트리트 페이지가 개설된다면 그땐 가죽 공예에 대해 쓰고 있으려나?
- 에디터
- 황혜진
- 포토그래퍼
- JUNG WON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