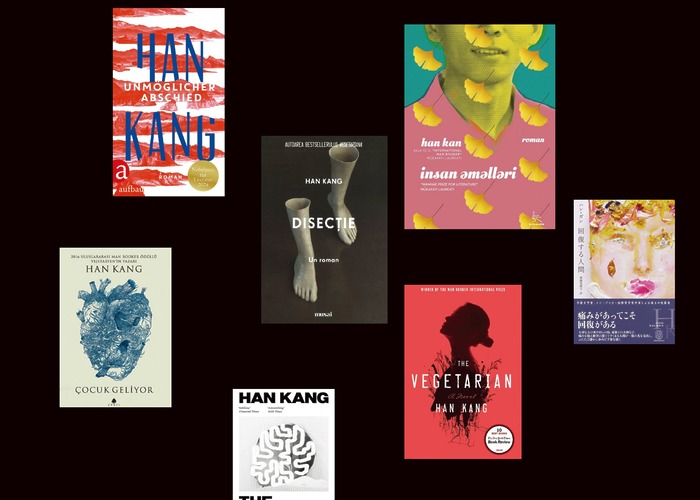천국보다 낯선
남태평양에 펼쳐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섬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다. 한 여행자가 지난 여행의 추억을 되새겼다.
토요일 오후, 타히티의 명물인 히나노 맥주를 마시며 상큼한 그린파파야 샐러드와 싱싱한 참치를 곁들인다. 빈티지 가구와 샹들리에 장식, 거대한 불상을 보고 있으면 이곳이 남태평양의 라이아테아(Raiatea) 섬에 위치한 레스토랑임을 잊게 된다. 맞은편에 앉은 타히(Tahiarii Pariente)는 모험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폴리네시안 이스케이프’의 설립자다. 그는 폴리네시아의 전통 의복인 파레오를 허리에 두른 채 말을 건넨다. “요즘 이곳의 젊은이들은 미국 문화에 열광해요. 나이키를 신고 배드 버니의 랩을 즐겨 듣죠. 하지만 우리의 문화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곳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투와 서핑만 해도 그렇죠!” 그의 양쪽 팔에 새겨진 정교한 문신과 멧돼지 어금니 장식의 목걸이가 자긍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전공인 폴리네시안 언어학에 대해 말하다가도 순식간에 LA의 맛집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능숙하게 전환하는 만담꾼이었다. 스스로를 ‘문화 코치’라 소개하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그를 찾는 것은 보라보라 섬의 오테마누 산을 등반하고 싶어 하는, 이를테면 도전정신이 충만한 여행객들이다. 타히는 섬의 새로운 세대를 상징한다. 섬이 수년간 간직해온 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외지인에게 섬의 문화를 성실하게 소개하고 공유하는 세대 말이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남태평양 중부의 광대한 해역에 걸쳐 흩뿌려진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계화된 현대사회와는 동떨어진, 태초의 자연을 간직한 에덴동산의 모습이 이러할까? 바다는 연금술사의 손길이 닿기라도 한 듯 희미한 청록색에서 강렬한 에메랄드색으로, 또다시 짙은 청색으로 서서히 물들어간다. 녹색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고리 모양의 산호초가 굽이굽이 이어지며, 쨍한 햇빛 아래 재스민이 탐스럽게 익어간다. 바닐라와 코코넛 열매의 향기를 가득 들이마실 수 있는, 이곳이 바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다. 프랑스의 항해가 부갱빌이 이곳을 발견한 덕분에 18세기를 대표하는 철학가 드니 드디로가 유토피아적인 사상을 꽃피울 수 있었다. 그뿐일까? 폴 고갱은 밝은 열대 섬의 색을 칠했고, 문학계의 거장인 허먼 멜빌과 윌리엄 서머싯 몸은 유유자적 휴식을 취하며 소설 집필에 몰두할 수 있었다. 고전 작가뿐 아니라 엘리자베스 길버트와 같은 현대 작가에게도 폴리네시아 섬은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장편소설 <모든 것의 이름으로>의 주인공은 필라델피아에서의 삶에 염증을 느껴 타히티로 떠나온 식물학자다. 이곳에서 그는 신비로운 마법 같은 경험을 한다.
환상의 섬으로의 도피는 인생에서 한 번쯤 가봐야 할 여행지로 꼽히게 되면서 조금 진부해지기 시작했지만 다행히 섬의 관광 판도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섬의 수도이자 유일한 국제공항이 있는 파페에테(Papeete)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며 숙박시설의 선택지도 다양해졌다. 저렴한 여관, 현지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 섬 전체를 예약해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독채 중 여행객은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갈 수 있게 됐다. 호텔은 스토리텔러, 공예가, 운동선수 등 지역 토박이와 협업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찔한 높이를 자랑하는 파도 타기에 도전하는 빅 웨이브 서핑과 프리 다이빙을 즐길 수 있고 현지 타투이스트에게서 전통 문양 타투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이곳의 단색 타투는 과거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됐을 정도로 중요한 예술이기에 조금 더 특별하다.
이전에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5개 제도에 속하는 소시에테 제도(Society Islands)를 방문한 적이 있다. 폴리네시아를 대표하는 보물인 흑진주 양식장을 방문하고 상어를 눈앞에서 보며 수영하고, 바닐라 농장도 탐험하는 등 이색적인 모험을 했다. 액티비티는 그때 쉴 새 없이 즐겼으니 이번에는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는 정적인 일정을 즐겨보기로 했다. 타하아(Taha’a) 섬에 있는 바히네 아일랜드(Vahine Island) 리조트의 목재 방갈로에 묵을 생각이다. 아침에는 우거진 야자나무를 바라보며 습한 날씨에도 바삭한 크루아상을 먹어야지. 또한 에코 게스트하우스인 바니라 로지(Vanira Lodge)에서도 며칠 지낼 예정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파도를 볼 수 있는 서핑지로 알려진 테아후푸(Teahupoo)에서 10분 남짓한 거리에 있다.
타히에게 드라이브를 하며 섬을 둘러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라이아테아 섬 외곽을 빙 두르고 있는 간선도로로 진입했고 나는 창밖의 절경을 내다보았다. 야자나무가 일렬로 서 있는 만과 바위해변, 밤나무가 울창한 열대우림과 폭포, 그리고 산봉우리에만 핀다는 신비로운 꽃인 티아레 아페타히(Tiare Apetahi)도 감상할 수 있었다. 남쪽 해변에 차를 세운 뒤 작은 배에 올라탔다. 5분 후 나오나오(Nao Nao) 섬에 도착했다. 이 작은 섬의 주인은 타히의 친구로 때묻지 않은 자연에 매력을 느껴 2000년대 초반부터 이곳에서 서핑, 낚시, 캠핑을 즐겼다고 한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마침 타히티 출신의 건축가가 폴리네시아의 가옥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덕분에 운 좋게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숙박 시설을 둘러볼 수 있었다. 집은 ‘에이토(Aito)’라는 경질 목재로 만들어졌는데 물, 염분, 세찬 바람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아 카누를 만들 때 사용된다. 기둥은 햇볕에 바랜 산호를 정성스럽게 이어붙여 만들었다. 래커 칠을 하지 않은 앤티크한 소재 몇 가지를 제외하면 집은 전반적으로 모던하고 미니멀했다. 가족이나 친구들, 아이들과 함께 머물며 스노클링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내의 100개가 넘는 섬 중에서도 투아모투 제도(Tuamotu Archipelago)의 누쿠테피피(Nukutepipi)만큼 특별한 곳은 찾기 힘들 것이다. 산호로 유명한 이 섬은 타히티로부터 남동쪽으로 600마일 떨어져 있는데, 세상의 모든 대륙에서 최소 4000마일 이상 떨어진 완전히 고립된 섬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던 섬을 사들인 것은 세계적인 명성의 ‘태양의 서커스’의 창립자인 가이 랄리베르테(Guy Laliberte)다. 그는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곳을 고급 휴양지로 만들었다. 섬 내에 태양열, 수력 발전기는 물론이고 허브와 야채, 과일을 수확할 수 있는 농장과 양봉장, 닭장까지도 갖췄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뿐 아니라 IT팀이 상주하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전세기를 타야만 하기에 나는 새벽 다섯 시부터 파페에테 공항에 도착해 미지근한 자판기 커피를 3잔씩이나 마셨다. 비행기가 연기된 것이 섬의 새들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누쿠테피피는 수많은 새의 안식처다. 새들은 침입종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고 쥐와 모기로부터 숲을 보호한다. 비행기는 새들의 활동이 제일 적은 시간대에만 뜰 수 있다고 한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산호 지역에 착륙했다. 사방으로 바다만 광활하게 뻗어 있을 뿐 다른 섬은 보이지 않았다. 이 완전한 고립이 베르테를 매료시켰다. “온전히 자연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에서 살다 보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 집중하게 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까지도 달라져요. 머리가 맑아지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음악을 최대 볼륨으로 틀어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베르테의 말이다. 발자국 하나 찍히지 않은 산호 해변을 걸으며 나는 문득 베르테가 세운 빌라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다. 이윽고 도착한 곳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자연의 풍파를 견딘 목재는 그윽한 멋이 느껴졌고 적삼목 지붕은 섬을 둘러싼 숲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화장실에는 산호초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리프 세이프(Reef-safe)’ 제품이, 바에는 멕시코에서 공수해온 진한 스모키 향의 전통주인 메즈칼(Mezcal)이 구비돼 있다. 아침에는 섬에서 난 달콤한 꿀이 듬뿍 든 생강 주스도 맛볼 수 있다. 소소한 행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교하게 조각된 작살 컬렉션을 구경할 수 있는가 하면 높다란 전망대에서 19세기의 황동 망원경을 통해 헤엄치는 혹등고래까지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마사지, 서핑 레슨, 레코딩 스튜디오, 파쿠르 수업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 섬의 최대 수용 인원은 52명으로 일주일을 보내는 비용은 약 11억원이다.
섬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폴리네시아 토박이 덕에 가능하다. 타히티에서 온 티티(Titi)와 함께 스노클링을 하며 두 시간 동안 가지각색의 산호를 구경했다. 형광 보라색의 투박한 산호부터 불꽃만큼 강렬한 오렌지색 산호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고 온몸에 노란 줄무늬가 있는 가오리가 바로 눈앞을 지나간다. 게스트하우스 ‘바니라 로지’의 주인장 부부는 내게 거대한 파도를 체험할 수 있는 서핑 포인트를 안내했다. 서핑 보드에 올라타 휘몰아치는 파도에 몸을 맡기면 마치 하강하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 이 섬에서는 산과 강, 섬에 관한 신화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다. 폴리네시아인들의 몸에 새겨진 정교한 소용돌이 문양의 파도 문신은 그들의 정체성을, 자연에 얽힌 신화는 그들의 역사를 말해준다. 그리고 이 섬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최신기사
- 에디터
- 정지원
- 포토그래퍼
- ALEX GROSSMAN, COURTESY OF NUKUTEPI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