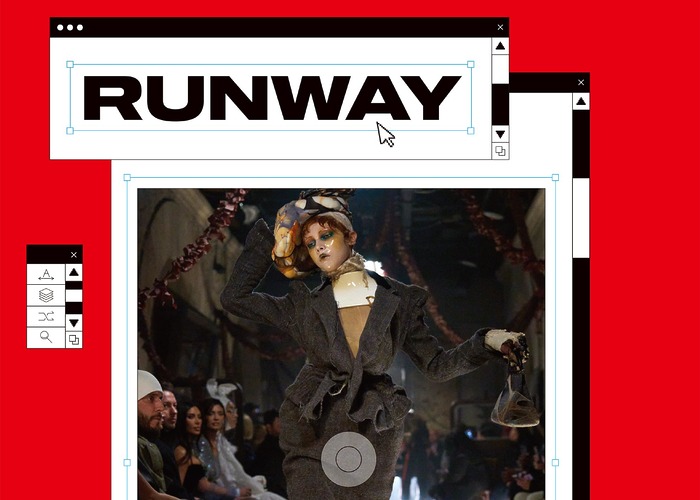다뉴브 강을 오가는 여정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다뉴브는 한때 왕성한 제국이기도 했던 도시를 관통한다. 크루즈를 타고 다뉴브 강을 오가는 여정은 시간의 흐름과 저항을 지켜보는 일이기도 하다.
부다페스트에서 오스트리아 동부에 이르는 다뉴브 강을 항해하는 일주일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배는 평화롭고 서정적으로 보이는 풍경 사이를 미끄러지듯 흘러간다. 가파른 강 주변으로 푸르고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다. 풍경과 날씨는 황홀할 정도로 좋아서 많은 사람이 바깥에 앉아 점심을 즐기고 있었다. 화창한 하늘 아래, 강과 가장 가까운 쪽의 공기만이 약간의 축축함을 머금고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두툼한 모직 담요를 펼쳐 들었다. 점심시간이고, 다양한 음식과 톡 쏘는 맛이 매력적인 매운 크림 치즈를 포함해, 알파인 치즈를 위주로 한 식탁이 재빠른 손으로 차려졌다. 이날의 여정인 오스트리아의 고전적인 두 도시 멜크(Melk)와 크렘스(Krems)를 찾아가는 길의 일이다.
멜크와 크렘스의 수도원
멜크는 언덕에 위치한 바로크 시대의 수도원과 그 역사로 유명하다. 베네딕트 수도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데, 그 모양을 멀리서 보면 진저브레드로 정교하게 만든 집처럼 동화적이다. 크렘스 역시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인근 언덕들은 최상의 그뤼너 벨트리너(Gruner Veltliner)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주변으로 종종 현대적인 건축물도 눈에 들어온다. 도시의 외곽으로 나가면 이륙 준비를 마친 듯한 거대한 우주선 모양의 은색 건축물을 만날 수 있다. 로어 오스트리아 주립미술관(State Gallery of Lower Austria)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아연 도금의 반짝이는 건물이 햇살을 받아 빛을 반사한다. 중유럽 사람들이 ‘그리움’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오랜 세월의 향수가 쌓인 곳에 최첨단 박물관이 우뚝 서 있는건 어쩐지 좀 어색해 보인다. 한때 합스부르크 제국의 자리였던 이곳의 강은 수세기 동안 여객선과 화물선으로 넘쳐났다. 부를 쌓고 번성하면서 호화로운 수도원은 물론이고 많은 성곽, 궁전, 공원이 터를 잡았다. 하지만 이후 유럽은 혁명, 전쟁, 재정 위기, 코뮤니즘 등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 후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한들 지난날의 영광을 회수하는 건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다뉴브 강은 서부와 동부가 경쟁하는 접전지가 됐고, 물 위를 떠다니던 수많은 배 또한 더는 자유롭게 항해하지 못했다. 다뉴브 강에는 여전히 지난 시절의 흔적과 추억이 존재하지만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와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시절로 돌아갈 순 없다. 그렇다면 크렘스의 저 은빛 갤러리는 또 다른 변화를 상징한다. 역사의 숨통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즉 희망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다뉴브 동부를 따라 항해하는 내내 왠지 모를 미래의 에너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 지역을 강으로 항해하는 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넓고 깊은 수로는 수세기 동안 이곳 사람들의 삶을 엮어온 하나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물이 흐르는 속도는 그 옛날처럼 변함없이 느긋한 편이다. 비록 부다페스트에서 비엔나로 향하는 서쪽 항해에선 급물살과 싸워야 했지만 말이다. 매일 해가 질 무렵, 정박했던 크루즈가 머물던 도시를 떠나기 시작하면 승객들은 멀어지는 그곳을 가만히 바라보곤 한다. 밤공기가 꽤 무거워질 때까지 갑판에서의 움직임은 계속된다. 해양 크루즈와 달리 이 여행에는 뚜렷한 리듬이 있다. 아침마다 커튼을 젖히면 크리스털 라벨호의 객실 창문 너머로 전날 밤과는 다른 풍경이 나타난다. 새로운 목적지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진다.
비엔나의 새로운 바람
비엔나에 가까워지면서 강은 도심을 통과하는 몇 개의 구불구불한 물줄기로 갈라진다. 봄에는 생명력이 더 강해져 갑판에선 강둑을 따라 늘어선 바, 호텔, 도시 해변의 북적이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면 생생하게 살아 있는 희망 가득한 느낌이 든다. 과거 냉전 시대의 음울했던 분위기는 이제 찾아볼 수 없다. “비엔나는 냉전 시대의 지도상으로 볼 때 막다른 골목이었어요”라고 이 지역의 여행기 <Danubia>을 쓴 사이먼 윈더가 말한다. “특히 외부인들은 환영받지 못했죠.”
배는 하룻밤 이 도시에 머물렀는데, 덕분에 비엔나가 지난날에 비해 얼마나 변화했는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경기침체 덕분에 옛 모습은 새롭게 개발된 대신 여전히 살아남았고, 특유의 웅장한 옛 건물들은 더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약간은 참고 있다는 듯 웅크리고 있었다. 펑키한 문신을 새긴 오스트리아의 패션 디자이너 레나 호스체크(Lena Hoschek)는 오래된 니트 공장을 개조한 목재 스튜디오를 작업실로 사용한다. 스튜디오 곳곳에는 웨스 앤더슨이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만난 듯한 특유의 레스토풍 의상이 즐비하다. 커다란 테이블과 드레싱 룸에선 몇 명의 스태프가 맞춤 디자인을 주문하는 고객들의 옷을 만들거나 응대하고 있다. “옛것과 새것이 충돌하면서 굉장히 근사한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라고 호스체크는 말한다. 자신의 쇼룸을 관망하듯 바라보면서 그녀는 옷과 비엔나,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전통의 모자 브랜드 클라우스 뮬바우어(Klaus Muhlbauer)의 공방은 다뉴브 강이 흘러가는 슈베덴플라츠에 위치해 있다. 이 가문은 1세기 전부터 이곳에서 모자를 만들고 있다. 뮬바우어는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브랜드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심했다. 강둑에 위치한 그의 공방에는 챙이 넓은 밀짚모자와 가볍고 장식적인 펠트 모자로 가득하다. 뮬바우어는 몇몇 시제품을 내보이며 “이 도시를 더 부각시키고 싶어서 제품 라인 자체에 비엔나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부다페스트를 지나 브라티슬라바로
여행 초기 부다페스트에서 만난 자유의 여신상은 많은 생각을 들게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구 소련이 나치를 몰아내고 세운 조각상은 부다페스트의 아픈 과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종려 나뭇잎을 치켜든 조각상은 러시아 쪽을 향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주변의 옛 건물을 어느새 새로운 용도로 개방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부터 변화는 시작됐다. 사업가들은 한때 유태인들이 모여 살던 버려진 건물들을 임시 개조해 사업을 시작했고, 이 모습은 이제 도시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인쇄소 겸 카페이자 즉석에서 티셔츠를 만들어 파는 프린타 디자인 숍(Printa Design Shop)을 포함해 다양한 가게가 자리를 잡았다. 또한 과거 메소닉 로지(Masonic Lodge)의 그랜드홀은 새로운 미스터리 호텔(Mystery Hotel)의 레스토랑으로 다시 태어났다. 수세기를 걸쳐 내려온 벽화들 아래쪽 벽면엔 트롱프뢰유 비디오 아트가 늘어서 있다. 크루즈가 정박해 있는 강 건너로 떠 있는 바지선은 사회주의 시절 선박용 유조선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이제 A38이라는 콘서트홀이자 바(bar)라는 걸 알 수 있다. 해 질 무렵 강을 바라보면서 술을 마시기에도 이상적인 장소다.
크루즈는 해 질 무렵 다시 부다페스트를 떠나 항해를 시작했다. 밤의 불빛으로 빛나는 건물들, 흥청거리는 바, 조용한 전원의 풍경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강둑의 신발들이 인상적이었는데, 철로 만들어진 이 신발 조형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파시스트 군대에게 학살당한 유태인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구 소련은 도시와 강 너머 지역까지 장악했는데, 그들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댐을 통해 당시의 잔재를 확인할 수 있다. 댐을 통과할 무렵 나는 아침 식사 중이었는데,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벽면이 크루즈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은 위압감이 느껴졌다. 이제는 상류 쪽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서서히 새로운 도시가 등장했는데,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다. 이 도시에는 한나절 정도 짧게 머물러 있었다. 도심 오른쪽으로 번쩍이는 비행접시를 얹은 듯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다리가 인상적이다.
브라티슬라바는 사회주의 통치하에 원래의 모습을 많이 잃은 도시인데, 오랜 시간 내려온 도시의 풍경은 새로 등장한 브루탈리즘 건물들에 의해 오히려 다채로운 면면을 품게 되었다. 도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호텔 키예프(Hotel Kyjev)다. 마치 묘비처럼 느껴지는 이 고층건물은 1973년에 지어졌다. 10년 전에 문을 닫아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방치되어 있었지만, 현지 사진작가인 루이지 오베르(Lousy Auber)가 산악등반가 팀과 함께 페인트 브러시와 스프레이로 건물 외관을 색칠했다. 흉물스러웠던 건물은 이제 옵아트 벽화로 다시 태어났다.
건축가이자 도시계획자인 마터스 발로(Matus Vallo)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과 함께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영국의 디자이너 케림 허드슨(Kerim Hudson)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액세서리 레이블인 파크타(Pakta)를 운영 중인데, 모두 런던에서 패션을 공부했다. “사람들은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어 해요.” 허드슨이 말한다. “아주 작은 노력에서부터 우리 모두는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낼 거예요.”
변화란 무엇일까? 런던에서 돌아와 카페 만델라를 차려 에스프레소를 서빙하는 바리스타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엔 항상 에너지가 있었지만, 역사를 거듭하며 억압되고 구속되었어요. 일종의 휴면 상태였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있어요. 우린 많은 걸 바꾸고 싶거든요.”
- 에디터
- 최지웅
- 포토그래퍼
- ALESSANDRA SPAIRANI
- 글
- 마크 엘우드(Mark Ellw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