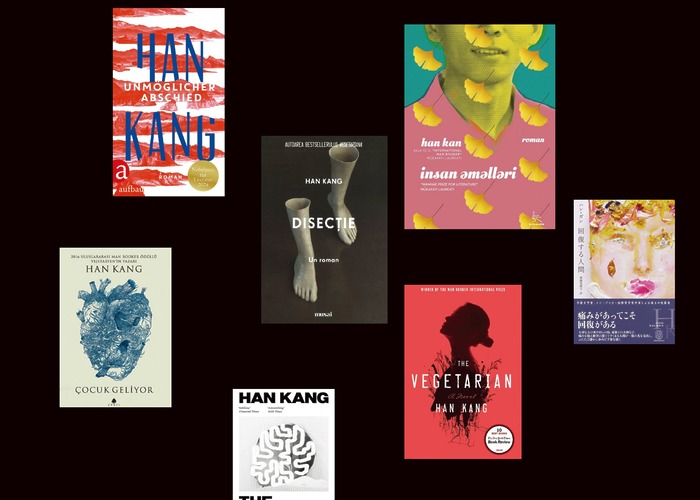이별은 위스키로 쓰세요
위스키를 마시던 중 이별한 연인. 혼자가 된 스스로를 위무하는 것도 결국 몇 잔의 위스키였다.
이별은 원래 뒤통수로 오지만, 그날의 이별은 생각할수록 무방비 상태에서 맞닥뜨린 퍽치기 같았다. “위스키 마실까? 코냑 마실까? 새로 산 술 있는데 그거 마실까? 왓 우쥬 라이크 투 드링크, 써?” 그게 이별 술상이 될지도 모르고 나는 꽤 둔한 농담을 눈치 없이 흩뿌리고 말았다. 집이었으니까, 늘 익숙하게 마주 보던 식탁 앞이었으니까, 평소보다 더 헐렁하게 웃어버린 것 같기도 하다. 싱글 몰트 위스키 맥캘란 12년 한 병과 장 뤽 파스케 코냑 한 병. 두 선택지 중 별 고민 없이 코냑을 골랐고, 서로 두 잔씩 비우는 동안 이별했다. 녹진한 맛이 부족해 톡 쏘는 듯했던 그 코냑 대신, 정신없이 향긋함을 발산하는 맥캘란 12년을 골랐다면 대화는 좀 다르게 흘렀을 수도 있었을까. 차가운 소주였다면 하소연으로 끝날 일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잔에 남은 코냑을 빈속에 들이붓고는 샤워를 했다. 고무로 즙을 낸다면 이런 맛이겠지. 신경질이 불쑥 났다.
글쎄, 이건 코냑 탓이 아니다. 여기저기 탓을 해봤자 그 무엇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안다. 내 이별은 누구의 이별과도 같지 않아서, 혼자 잊고 묻고 지우고 덮어야 한다는 것도 경험으로 안다. 어느 영화였는지도 희미하지만, 여자 주인공이 헤어지면 남는 건 입다 늘어난 남자친구의 티셔츠뿐이라고 탄식하더니, 과연 집 안 곳곳 애인의 티셔츠가 수북했다. 위스키 로고 티셔츠, 브루어리 방문 기념 티셔츠, 맥주 사은품 티셔츠…. 술 좋아하는 커플의 웃긴 허물들…. 섬유유연제를 잔뜩 넣고 빨아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한 벌씩 입고 잤다. 티셔츠에 얼굴을 파묻고 꺽꺽 우는 것보다 바득바득 이별과 싸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다. 눈물이야 마음먹으면 언제든 왈칵 쏟아졌지만, 목욕한 대형견처럼 푸드득 그 감정을 털어내려고 애썼다. 애쓰면 통했다. 이게 나이의 힘인가, 좀 웃기도 했다. 그렇게 추켜세운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시간은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다. 번잡스러웠던 낮의 일들이 사그라들고, TV도 휴대전화도 모두 조용해지면 좋았던 추억들이 베개 아래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애인과는 싱글 몰트 위스키 발베니를 마시면서 사귀기 시작했다. 내 나이와 같은 시간 숙성한 발베니의 반의 반 병을 참새처럼 나눠 마셨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화지 같을 때, 매일매일 진하고 빼곡하게 놀았다. 배경음악이 깔린다면 이게 바로 뮤직비디오겠거니, 하는 순간들이 아직도 수두룩하다. 그 기억이 물꼬를 트는 밤이면 술 없이 누워 있는 암흑 속 5분이 그저 다섯 시간 같다. 그럴 땐 바득바득 추억의 샅바를 맞잡으려고 발베니를 꺼내 마신다. 유독 달큼하고 보드라운 위스키라 한잔 입에 넣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더 에인다. 명치 쪽이 저릿저릿할 때마다 헛기침을 좀 한다. 알코올로 두 볼이 좀 따뜻해졌을 때쯤엔 하나의 생각에 봉착한다. 나는 왜 이별에서 빠져나오기가 매번 이렇게 힘들까. 추리고 추린 답은 이것이다.
나는 애인과 만든 추억들이 날아간다는 게 속상해 미치겠다. 좋은 술 마시며 황홀하게 보낸 그 시간들이 새는 돈처럼 아깝다. 이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면 추억을 아껴둔 적금처럼 여길 수도 있었을 텐데, 혼신의 힘을 다해 쌓은 멋지고 근사한 추억이 비트코인보다 더 쓸모없어졌다는 게 분통이 터진다. 12년간 애써 숙성시킨 위스키에 맹물을 왕창 부어버리는 기분이랄까.
괜한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는 밤은 이제 좀 지나갔다. 요즘은 주먹보다 큰 온더록스 잔에 위스키를 조금 따라, 마시지 않고 머리맡에 둔다. 그 위스키가 8시간 동안은 거뜬히 계속 향을 뿜는데, 그 향이 빗소리나 낮게 깔아둔 TV소리보다 더 위로가 될 때가 있다. 이별한 사람들에게는 좀 더 절절한 한잔이자 묵묵한 친구다. 뉴욕의 큰 언니 캐리 브래드쇼가 2019년에도 있다면, 맥북 앞에 담배 한 대를 입에 무는 대신 위스키 한잔을 손에 쥐었을 테다. 오늘은 글렌드로낙 18년을 마셨다.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곳에서, 고개를 젖히고 크게 웃으면서 여러 잔을 비웠다. 술잔에 코를 박고 향에 젖을 때는 행복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다. 다 마신 빈 병을 코트 품에 넣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저 사라지고 없어지는 모든 것이 지금은 싫다. 집에선 노란 불빛을 켜고 발베니 한 잔을 더 마셨다. 울지 않고 “캬”만 했다.
최신기사
- 에디터
- 허윤선
- 글
- 손기은(푸드 칼럼니스트)
- 포토그래퍼
- KIM MYUNG 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