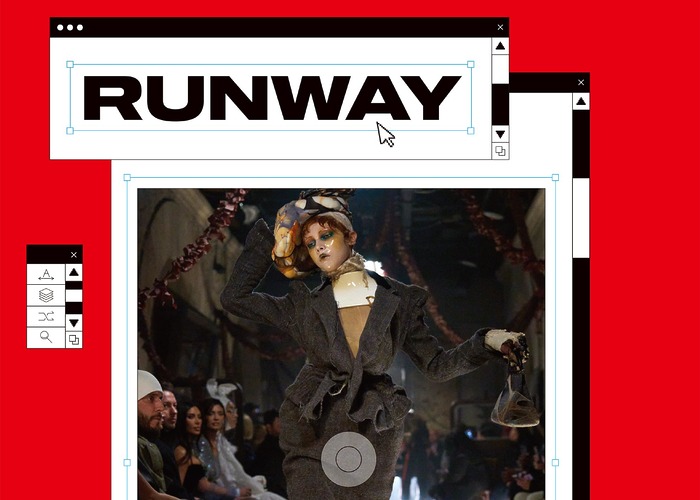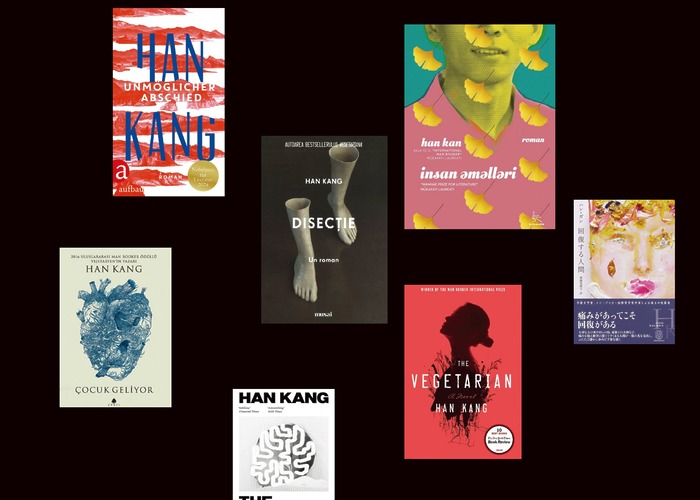좌절과 폭력과 '여혐'의 나라
슬프고 힘드니 위로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넘어, 한번 좌절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거대한 스트레스의 나라
한국에서, 여성을 향한 지금의 혐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이런 의문만 남았다. 가장 최근의 발단은 단연 장동민, 유세윤, 유상무가 그들의 팟캐스트 ‘옹달샘의 꿈꾸는 라디오’에서 1년 전에 했던 말이다. “여자들은 머리가 멍청해서 안 된다”, “참을 수 없는 건 처녀 아닌 여자” 같은 말. 더한 말도 있었지만 굳이 여기 옮기고 싶지는 않은 말.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섞고,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 저버린 말. 몇 달 전에는 방송인 김태훈이 격주간지 <그라치아>에 쓴 글 “무뇌아적 페미니즘은 IS보다 위험하다”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현재의 페미니즘은 뭔가 이상하다. 아니, 무뇌아적인 남성들보다 더 무뇌아적이다. 남성을 공격해 현재의 위치에서 끌어내리면 그 자리를 여성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한다.” 김태훈은 예정돼 있던 방송에서 하차했다. 장동민의 방송 퇴출을 요구하는 일인 시위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장동민과 김태훈의 이름을 굳이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의 말과 글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다양한 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면 댈수록, 예민하게 보면 볼수록 사례 역시 풍성해질 것이다. 무의식중에 넘긴 모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마다, 그럴수록 참담해지는 마음을 견딜 수 있다면.
다시,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앞서 말한 발언들을 ‘여혐’이라는 말로 묶는 마음조차 실은 좀 불편하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하니까, 그 단어로 이 현상을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그 실체에 힘이 실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하지만 불편하다는 말조차 안이하게 여겨지는 나라가 지금의 한국이다. ‘엣흠’ 헛기침 한 번 하고, 불편하니 외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의 ‘여성 혐오’는 그 말의 의미 자체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이해하고자 애를 써야 하는 수준까지 왔다.
일단 2000년대 초반으로 올라가볼까? 20세기 말의 짤막한 호황으로부터, 갑작스럽고 혹독한 불경기를 속수무책으로 견뎌야 했던 그때, 여자를 수식하는 말에 김치, 스시, 된장 같은 말이 붙기 시작했을 때로 말이다. 그건 명백한 조롱이면서 설명도 민망할 정도의 일반화였다. ‘허영, ’‘사치’ 같은 말로는 해소할 수 없는 누군가의 분노가 쌓여 만들어낸 말에 불과했다. 스타벅스와 명품백은 애꿎게 상징이 되었다. 그런 말을 폐쇄적인 집단에서, 스스로를 깎아 내리면서, 다분히 자학적인 느낌으로 ‘낄낄대면서’ 하는 커뮤니티도 분명히 있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단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는 뜻이다. 시대는 나아지지 않았고, 그 집단은 점점 더 커졌다. 이제 그들을 두고 아무도 ‘불과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소수인 줄 알았던 ‘일베’라는 단어에도 대표성이 생겼다. ‘일베’는 어느덧 단단한 상징이자 실체, 사회학 논문의 주제가 되었다.
분석은 이미 나와 있다. 혐오와 혐오, 그들이 ‘놀이’라고 주장하는 현상 자체의 불쾌와 공포를 떠나,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14년 9월 제367호 <시사in>의 커버스토리 ‘일베 코드’를 참고하면 그들의 사고 체계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 천관율 기자가 쓴 기사 ‘이제는 돌아와 국가 앞에 선 일베의 청년들’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좋은(‘김치녀’가 아닌) ‘여자친구’를 만나 ‘서울’에 자리 잡고 ‘가족’을 이루는 꿈. 인터뷰를 한 일베 이용자들 대부분이 바라는 미래상이었다. 인터넷에서는 극단적 여성 혐오를 쏟아내고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는 폭식투쟁을 하던 그 일베가 맞나 싶은 평범함.”
진중권 교수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그런데 경제가 안 돌아가다 보니, 남자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림. 거기서 과거라면 거들떠도 안 봤을 일자리를 놓고도 여성과 경쟁한다는 의식이 생김. 이게 군가산점 논란의 배경이야. ‘2년간 군생활로 낙오됐으니 가산점 달라.’ 나름 처절한 거지.” <시사in>이 ‘일베’를 분석하기 약 2년 전, 2012년 10월 8일에 남긴 멘션이다. 이 멘션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는 그 맥락에 대한 알 법한 설명이 이어져 있다. 물론, 각각의 멘션에 ‘예상할 법한’ 멘션 또한 댓글처럼 줄줄이 이어져 있다.
2015년 5월 7일자 <헤럴드 경제> 기사, ‘좌절, 분노에… 여성, 중국동포, 장애인 혐오도 넘었다’가 밝힌 전문가 견해를 보면 혐오의 실체는 좀 더 확실해진다.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 남성들이 점점 가중되는 좌절과 분노를 견디다 못해 약자인 여성에게 그 감정을 투사함으로써 공동의 적을 형성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은 서로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가 여성 혐오 표현의 기저에 깔려 있다”. 서울대 기초교육원 김수아 교수의 생각은 이렇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됐는데 이에 위기감을 느낀 남성들 상당수가 여성을 적대시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대체로 혐오 표현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위기를 느낀 주류 집단이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 무고한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하지현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소통을 배우지 못한 구성원들은 약자에게 분노와 억울함을 비겁하게 표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 연애, 결혼, 육아, 주거조차 경쟁과 쟁취의 결과가 되었다. 이긴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트로피 같다.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의 커뮤니티가 된 공동체의 기능은 감정 분출의 통로로만 제한됐다. 사회학자 엄기호는 2014년 5월,
장동민과 김태훈으로부터 시작한 얘기가 여기까지 왔다. 코미디언과 칼럼니스트의 말과 글로부터, 일간지와 시사 주간지의 분석을 참고해야만 했다. 일단의 이해도 여기까지다. 이제는 원래는 폐쇄적이었던 커뮤니티의 화법이 별다른 제재 없이 방송과 잡지에서 발화됐다는 점, 그 과정에서 누구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의해야 옳다. 명백한 폭력인데도, 그것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을 두둔하고자 했던 다른 목소리도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선 같다. 여기에 평범한 5월의 주말에 여러 사람의 심기를 건드린 <한겨레> 주말판의 기사,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 우리의 자식을 기다린다”를 다시 한 번 볼까? 그 기사가 하는 말도 결국 폭력의 반복이었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 보통 남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라고 쓰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가려는 아내, 사업을 해보겠다는 자신의 꿈을 이해 못하는 아내를 불행의 원인으로 겨냥했다. 시대가 이래서 내가 힘들다는 말을 소비하는 가장 못된 방식이다. 사실 관계는 물론 기자의 이름조차 없었던 그 기사에서, 지금 우리가 힘든 원인과 결과가 맥락도 없이 흩어졌다. 우리가 ‘힘껏 달리지만 겨우 제자리에 서 있는 게 고작인 나라’에 살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여자인 아내 때문은 아니다.
이건 거대한 얘기다. 개인적인 감수성부터 시대의 흐름까지 읽어야만 제대로 된 맥락을 짚을 수 있다. 미국에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말을 활발하게 쓰기 시작한 것도 20세기 후반 아니었나? 아직 50년도 안 됐다. 지금 한국에선 그 말조차 우스개로 소비해버리고 마는 흐름이 있다는 걸 안다. 힘들고 더딘 일을 일단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일상적인 폭력의 체계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런 판에서 젠더(Gender), 성역할, 남성성과 여성성 같은 말을 처음부터 해야 할까? 괴테가 한 이런 말은 어떨까? “세계는 세계의 전진을 거부하는 사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간다.” 그 거부의 양식이 다양한 수준의 폭력이라도, 그것이 폭력임을 알리는 일을 멈춰선 안 된다. 혐오의 논리가 공개된 만큼, 그들의 말이 잘못됐음을 알릴 수 있는 통로 또한 열려있기 때문이다. ‘여혐’ 같은 말에 상처받을 일 없이,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꾸준히, 집요하게.
최신기사
- 에디터
- 피처 에디터 / 이마루
- 글
- 정우성(
피처 에디터)
- Illustration
- Heo Jung 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