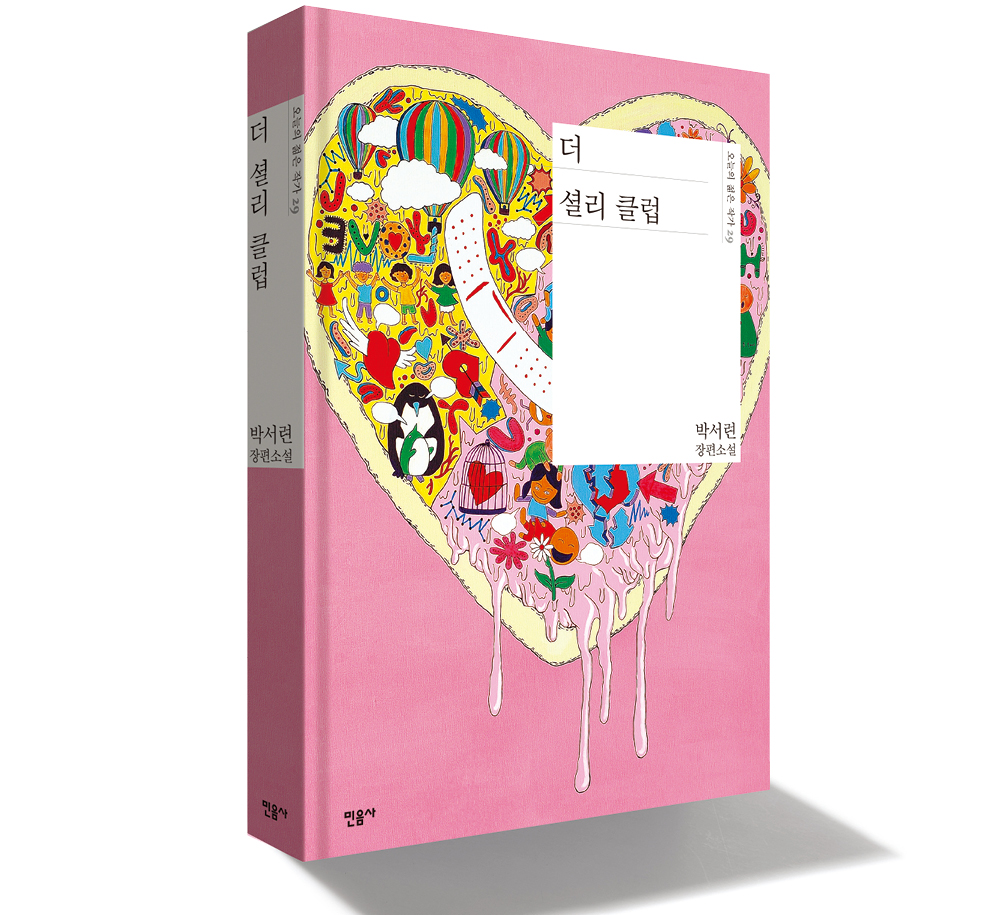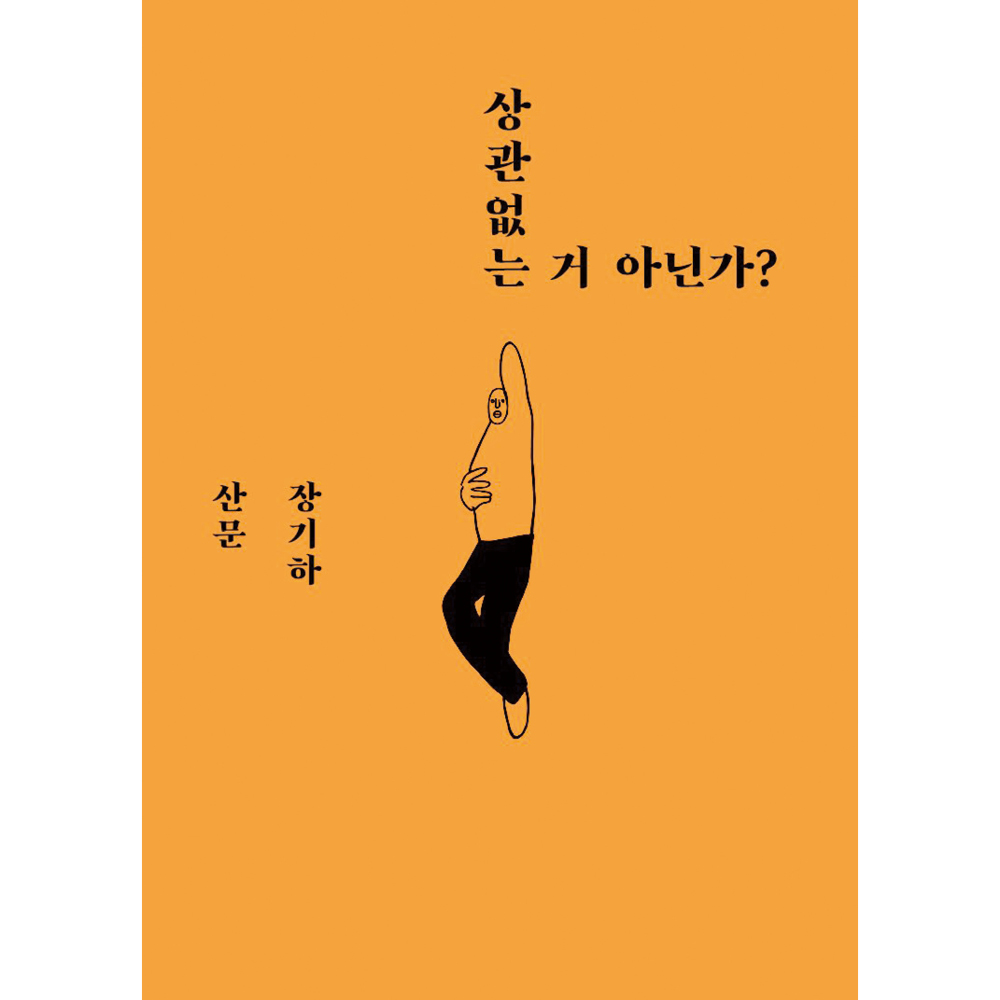11월에 주목해야 할 책 소식
내 머리맡의 책
몇 달 전 시작한 오디오클립을 진행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자기 전에는 어떤 책을 읽는가?” 예전에는 소설을, 그리고 인문학 책을 읽었다면 요즘 자기 전에 읽는 책은 주로 산문이다. 중간에 끊기 아쉽고, 흐름이 중요한 소설은 불면증세에 좋을 게 없기도 하거니와 에세이가 주는 아주 평범한 공감이 베개맡에서는 더 잘 어울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캐럴라인 냅의 <명랑한 은둔자>는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침대를 독차지하는 사람들에게 윙크를 건네는 것만 같다. 저널리스트였던 그녀의 글은 칼럼 같기도 한데, 바로 그런 명확한 면이 통쾌하다. 42세에 지병으로 일찍 사망한 그녀는 생전에 혼자로서의 삶, 인간으로서의 고독을 용감하게 마주하는 글을 남겼고, 그 면면이 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다. 시인 그리고 시집 서점 위트앤시니컬을 운영하는 유희경의 첫 산문집 <반짝이는 밤의 낱말들>은 아주 느릿하게 우리에게 왔다. 10년 동안 시를 쓰는 사이 틈틈이 써온 글은 다시 말해, 그 순간만 쓰여질 수 있었던 글이다. 시와 산문의 중간쯤, 시 같은 산문 같기도 산문 같은 시 같기도 한 글은 어느 밤의 상념을 투명한 유리병에 접어둔 것만 같다. 버스, 우산, 베란다, 극장… 같은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어느새 평범하지 않은 인사를 건넨다. 모든 것은 바라보기 나름이며,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진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수면제를 삼키듯 잠들기 전 그의 낱말들을 삼키곤 한다.
이름이 뭐예요
두 소설 속 이름을 불러본다. 복자, 그리고 셜리다. 김금희의 신작 <복자에게>는 어린 시절 집안 사정으로 제주의 한 섬에 전학가게 되며 만난 친구 ‘복자’를 기억한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삶이 지워준 각자의 사정이 있다. <더 셜리 클럽>은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로 떠난 설희, 영어 이름 셜리의 이야기다. 셜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의 모임 ‘셜리 클럽’에서 셜리 할머니들을 만난다. 이름으로 시작된 어떤 이야기.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N번방을 세상에 꺼낸 주역인 추적단 불꽃 ‘단’과 ‘불’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제목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된다. 우리가 아파했고, 우리가 분노하고 연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끔찍한 범죄 N번방의 최초 보도자인 추적단 불꽃은 취업을 위한 탐사 심층 르포 공모전을 위해 처음 N번방 취재를 시작하지만 이들 앞에 펼쳐진 것은 믿을 수 없는 지옥도였다. 그 과정을 담은 1부, 두 사람의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은 2, 3부 역시 우리의 이야기다.
NEW BOOK
<상관없는 거 아닌가?>
언젠가 만나게 될 줄 알았다. 장기하의 책 말이다. 그가 쓴 가사, 멜로디, 말은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까웠다. 이제 책을 쓸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는 장기하의 글은 농치듯 일상을 말랑하게 담다가도 그 안에 단단한 뼈가 느껴진다. 한 권으로 끝내긴 아쉽다. 벌써 다음 책이 궁금하다.
저자 장기하 출판 문학동네
<쓰지 않을 이야기>
팬데믹이 시작된 후 벌써 10달이 지났다. 2020년 제각기 처음 겪는 일들로 허둥지둥했지만 그 사이에서도 자기 몫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설가의 일이라면 소설을 쓰는 것. 네 명의 작가가 ‘팬데믹 시대’를 바라보며 소설을 썼다. 기묘한 시대를 마주한 조수경, 김유담, 박서련, 송지현의 소설이 실려 있다.
저자 여러 저자 출판 아르테
<모두가 세상을 똑같이 살지는 않아>
2019년 제117회 공쿠르상을 거머쥔 작품. 프랑스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뒤, 아파트 관리인으로 살아온 한 남자는 우연한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불행 속에서도, 감옥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도 삶은 매순간 ‘선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저자 장폴 뒤부아 출판 창비
최신기사
- 에디터
- 허윤선
- 포토그래퍼
- JEONG JO SE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