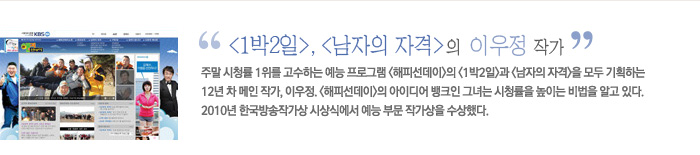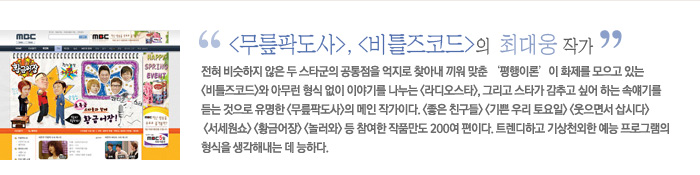요즘 방송계는 예능 프로그램이 장악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시청률 30%를 넘기는 드라마는 없어도 <1박2일>, <무한도전> 등 버라이어티는 많다. 웃음을, 눈물을, 때로는 감동을 주는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의 작가 5인을 만나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다.
‘시청률 68%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있더라. 비결이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지리산 등반을 기획하면서 처음에는 ‘이걸 누가 볼까? 처음부터 끝까지 걷기만 할 텐데’ ‘웃긴 게 하나도 없는데 괜찮을까?’ 걱정도 많이 했다. 그런데 게임이나 레이스할 때보다 시청률이 더 잘 나왔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걸려라, 걸려라’ 주문을 걸면서 부비트랩을 설치하는 거다. 연기자들에게 지도 하나만 달랑 주고 찾아오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헷갈릴 만한 지점에서 ‘여기서 길을 잃으면 재미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함정을 설치하는 것이다.
요즘 시청자들은 어떤 것에 반응하나?
진짜. 예전에는 MC들이 밥을 굶고 밖에서 자는 걸 ‘진짜’로 생각하고 만족했는데, 지금의 시청자들은 ‘더 진짜’를 원한다. 연기자가 무심코 던진 멘트 하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는 거다. 예전에는 아침에 복불복하고, 저녁엔 게임하자는 식으로 회의를 했다. 회의의 내용은 탁구가 좋을까, 배드민턴이 좋을까 하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이번 주에는 연기자들이 신나 하는 걸 보여주면 어떨까’ 등의 감정적인 주제를 정하는 회의를 한다. 제주도 가파도에 갔을 때에도 그랬다. 결과물로 보면 ‘제작진이 사라진다’는 콘셉트가 먼저 보이겠지만, 우리가 고민한 건 엄태웅과 출연진이 어떻게 하면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였다. 집에 부모님이 없으면 친구들 불러와서 먹지 말라는 것도 먹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사라진 거다.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됐나?
<1박2일>의 시작은 아날로그 감성이다. ‘여행을 하자’ 해서 시작된 프로그램도 아니고, ‘복불복을 하자’고 시작된 것도 아니다. 프로그램의 형식을 먼저 정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감성을 먼저 정했고,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일요일 시간대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등목이나 하면 좋겠다’ 하는 감성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똑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느티나무 아래에서 하는 거랑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해운대에서 워크맨 틀고 놀았던 촌스러운 여행을 연예인들이 하면 어떨까, 했던 거다.
리얼 버라이어티는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찾기가 어렵지 않나?
웃음을 주는 방법의 문제다. 옛날의 웃음은 PD와 작가가 회의를 해서 ‘이부분에서 웃기자’ 하는 포인트가 있었다. 예를 들어 <천생연분>에서 연예인이 상대에게 거절당하고 물대포를 맞으면 그걸 보고 웃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웃음이 잘 통하지 않는다. 시청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요즘 시청자들은 만들어진 웃음에는 별로 감동하지 않더라. 리얼리티로 시작된 자연스러운 웃음을 더 선호하는 세상이 왔다.
김C의 빈자리에 엄태웅 씨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능감이 있거나 웃기는 멤버는 필요 없었다. 지금 멤버로도 충분하니까. 오히려 지금 멤버들에게 좋은 먹잇감, 신기한 사람, 해맑은 사람이 필요했다. 만약 우리가 엄태웅 씨를 보면서 ‘예상할 수 있는 캐릭터’였다면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청자도 예상할 테니까. 엄태웅 씨를 멤버로 결정할 때까지 우리는 그를 딱 한 번 만났다. 그에 대해 더 알면 선입견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면 참견을 시작하게 될 테니까. 우리에게 신기하고 신선한 인물일수록 시청자에게도 신선할 거라 생각했다.
<무릎팍도사>는 어떻게 기획되었나?
<황금어장>은 원래 ‘우리동네 실화극장’이라는 콩트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프로그램 초기에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 ‘변형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담당 CP와 PD가 토크쇼를 하고 싶어 했는데, 알다시피 강호동이란 인물이 세련된 진행이 가능한 MC는 아니지 않나. 토크쇼는 미국식 장르인데, 강호동은 그게 맞지 않았다. 씨름도 했고, 콩트도 했고, 토속적인 사람이고, 사투리도 쓰고. 그래서 ‘토속적인 한국형 토크쇼는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도사’ 설정과 코미디에서나 할 수 있는 ‘ㄷ’자 콩트 세트를 생각한 것도 그 때문이다. <무릎팍도사>가 방송을 타니 시청자분들이 좋아해주시더라.
그러면 <무릎팍도사>는 강호동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나?
당연하다. MC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니까. <무릎팍도사>의 MC가 유재석 씨였다면 지금 <무릎팍도사>의 성격은 <놀러와>와 비슷했겠지.
제작진이 ‘콘셉트를 바꿔야겠다’고 느끼게 될 때는 어떤 때인가?
그 감은 제작진이 느낄 수도 있고, 국장님 때문에 느낄 수도 있다. 위에서 ‘바꿔라’ 할 때도 있으니까. 노련한 제작진일수록 ‘바꿔라’ 하기 전에 바꾼다. ‘바꿔라’는 지령이 떨어질 때는 이미 말기암 정도 되는 거다. 제작진이 ‘바꾸자’고 논의할 때는 암 초기 정도 되는 거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랄까. 프로그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제작진이 스스로 잘 안다. 노련한 제작진일수록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나만 해도 들이는 공에 비해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 내가 봐도 재미없을 때 ‘바꾸자’고 한다. 나도 시청자니까.
최근 <무릎팍도사>의 질문 수위가 약해졌다는 평이 많다.
이전의 토크쇼들은 게스트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토크쇼였다. 그래서 시청자와 괴리감이 있었다. 그래서 ‘바꿔보자’고 생각했다. 시청자의 궁금증을 채우다 보니 게스트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질문도 있고, 수위가 높은 질문도 있었다. 그런데 <무릎팍도사>는 얄팍한 질문은 배제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대화 주제가 방송에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게스트의 인생 전체를 투영하려고 한다. 질문의 수위를 정한 적은 없다. 묻고 싶은 걸 줄곧 물어왔다. 센 질문을 던지려고 한 적은 없다.
방송에 내보내지 못했던 재미있는 일화는 없나?
방송에 내보내지 못할 정도였다면 나도 발설할 수 없다. 방송가 뒷얘기로 책 쓰자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안 쓸 생각이다.